RENASCENCE : Candida Höfer 사진전
Candida Höfer was introduced at the art book curation pop-up event of "Kunstakademie,” by Harbour Press. A first-generation Becher student at the Düsseldorf School of Art, she displayed her solo exhibition for the first time in four years. As soon as you enter the bright white exhibition hall K2 of Kukje Gallery, you can see a spiral staircase and red curtain in her photo.
When I faced each work, I felt as if I was there. The overwhelming experience of being alone in a huge space… Standing in front of photos of grand venues like an opera house, library, and art galleries, all of which have a specific purpose of existence, I felt my own existence and wondered what to do with it. So I looked into each photo closely, one by one.
New sound equipment installed on the wall of Berlin's Komische Oper caught my eye. Built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had existed for a long time, this opera theatre has been found to be not just about maintaining its previous appearance, but continued to play its role by applying modern technology.
Just then, the title of the exhibition, 'Renaissance', made sense to me. I got to gauge what she was trying to capture with her camera through photos of spaces that temporarily closed due to the pandemic. The French word 'Renaissance' means ‘Revival’. The 14 works the artist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contain places that have been renovated and rearranged. In particular, the artist visited and photographed these places during the pandemic. I was also enlightened to the fact that these places that have served as public institutions for a long time, used temporary closures as an opportunity for revival and reform. Through the pandemic and social distancing, what seemed like that which should be lost or given up, was in turn renewed and ultimately brought courage, at least to me.
In this way, Candida Höfer's work is based on an exploration of the role and meaning of a place as a public institution. The artist's work is direct with perfect symmetry and sharp images. However, the appearance of the space left behind contains the dynamic of the changes that happen with the passage of time. Candida Höfer's exhibition, which makes you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time, and people, is until July 28.
RENASCENCE : Candida Höfer
@KUKJE GALLERY
— 2024.7.28
read on instagram
Candida Höfer was introduced at the art book curation pop-up event of "Kunstakademie,” by Harbour Press. A first-generation Becher student at the Düsseldorf School of Art, she displayed her solo exhibition for the first time in four years. As soon as you enter the bright white exhibition hall K2 of Kukje Gallery, you can see a spiral staircase and red curtain in her photo.
When I faced each work, I felt as if I was there. The overwhelming experience of being alone in a huge space… Standing in front of photos of grand venues like an opera house, library, and art galleries, all of which have a specific purpose of existence, I felt my own existence and wondered what to do with it. So I looked into each photo closely, one by one.
New sound equipment installed on the wall of Berlin's Komische Oper caught my eye. Built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had existed for a long time, this opera theatre has been found to be not just about maintaining its previous appearance, but continued to play its role by applying modern technology.
Just then, the title of the exhibition, 'Renaissance', made sense to me. I got to gauge what she was trying to capture with her camera through photos of spaces that temporarily closed due to the pandemic. The French word 'Renaissance' means ‘Revival’. The 14 works the artist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contain places that have been renovated and rearranged. In particular, the artist visited and photographed these places during the pandemic. I was also enlightened to the fact that these places that have served as public institutions for a long time, used temporary closures as an opportunity for revival and reform. Through the pandemic and social distancing, what seemed like that which should be lost or given up, was in turn renewed and ultimately brought courage, at least to me.
In this way, Candida Höfer's work is based on an exploration of the role and meaning of a place as a public institution. The artist's work is direct with perfect symmetry and sharp images. However, the appearance of the space left behind contains the dynamic of the changes that happen with the passage of time. Candida Höfer's exhibition, which makes you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time, and people, is until July 28.
칸디다 회퍼는 하버프레스의 아트북 큐레이션 '쿤스트 아카데미' 팝업에서 소개한 적 있는 작가다. 뒤셀도르프 아트스쿨에서 나온 1세대 베허 학파로서 유형학적 사진의 대가인 그가 4년 만에 국내 솔로 전시를 한다기에 한달음에 달려갔다. 국제갤러리 K2 관의 새하얀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사진 속 나선형의 계단과 붉은 커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각각의 작품을 마주하고 서면 마치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거대한 공간에 나 홀로 존재하는 압도적 경험. 오페라 하우스, 도서관, 미술관과 같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공간에 홀로 존재하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갈팡질팡하다 구석구석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었다.
베를린 코미셰 오페라의 벽면에 설치된 신식 음향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후반에 지어져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온 이 오페라 극장은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며 현대의 기술을 적용해 지금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전시의 제목 ‘르네상스’가 단박에 이해되었다. 일시적 폐쇄를 통해 새로워진 공간을 사진기에 담은 작가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르네상스’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다.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14점의 작품들은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해 재정비한 장소들을 담고 있다. 특히 작가는 팬데믹 기간에 이 장소들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공공 기관으로서 역할해온 장소들이 일시적 폐쇄를 회생과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에 지혜를 얻었다. 전 세계적 위기로 여겨진 팬데믹과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가 잃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용기가 생겼다.
칸디다 회퍼의 작품세계는 이처럼 공공기관이라는 장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작가의 작품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거나 날카로운 이미지로 고요하고 선명하다. 그러나 남겨진 공간의 모습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의 역동성이 담겨있다. 장소와 시간,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칸디다 회퍼의 전시는 7월 28일까지이다.
르네상스 : 칸디다 회퍼
각각의 작품을 마주하고 서면 마치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거대한 공간에 나 홀로 존재하는 압도적 경험. 오페라 하우스, 도서관, 미술관과 같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공간에 홀로 존재하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갈팡질팡하다 구석구석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었다.
베를린 코미셰 오페라의 벽면에 설치된 신식 음향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후반에 지어져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온 이 오페라 극장은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며 현대의 기술을 적용해 지금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전시의 제목 ‘르네상스’가 단박에 이해되었다. 일시적 폐쇄를 통해 새로워진 공간을 사진기에 담은 작가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르네상스’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다.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14점의 작품들은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해 재정비한 장소들을 담고 있다. 특히 작가는 팬데믹 기간에 이 장소들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공공 기관으로서 역할해온 장소들이 일시적 폐쇄를 회생과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에 지혜를 얻었다. 전 세계적 위기로 여겨진 팬데믹과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가 잃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용기가 생겼다.
칸디다 회퍼의 작품세계는 이처럼 공공기관이라는 장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작가의 작품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거나 날카로운 이미지로 고요하고 선명하다. 그러나 남겨진 공간의 모습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의 역동성이 담겨있다. 장소와 시간,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칸디다 회퍼의 전시는 7월 28일까지이다.
르네상스 : 칸디다 회퍼
RENASCENCE : Candida Höfer
@KUKJE GALLERY
— 2024.7.28
read on instagram







Weaving as Metaphor by Sheila Hicks
![]()
![]()
![]()
![]()
Weaving as Metaphor는 2006년 Bard Graduate Center New York City에서 주관한 전시 도록이다. Hicks의 방대한 작업물 가운데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작품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컬렉터와 미술관 등에 협조를 구해 작품을 빌려와 했던 특별 전시다.
전시를 기획한 Nina Stritzler-Levine은 우연한 계기로 Hicks의 작은 사이즈의 작업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작가의 소규모 작업들이 예술성과 수공예, 디자인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며, 장식예술이 하급 문화로 사료되었던 인식을 흔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 실들이 가로와 세로로 만나며 이루는 모습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텍스타일을 통해 정치나 사회 등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Bard Graduate Center]()
![©Bard Graduate Center]()
![©Bard Graduate Center]()
이를 알고 나면 이 책의 디자인 역시 서사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날줄과 씨줄이 만나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작가의 철학처럼 이 책은 글씨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컬러의 대비를 통해, 여백 공간을 십분 활용해 내용과 호흡하며 디자인으로 하나의 서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
![]()
![]()
마침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셰일라 힉스 전시가 열리고 있어 다녀왔다. 전시는 Weaving as Metaphor에서 작은 작품을 다룬 것과 반대로 공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사이즈 작품 3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시장의 한 켠에는 셰일라 힉스와 관련된 책들이 놓여져 있었다.
![]()
![]()
![]()
![]()
그중 한 전시 도록에 실린 인터뷰가 가슴에 남았다.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거장이기에 그의 오랜 작업에 대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인터뷰를 준비했던 것 같다. 긴장한 인터뷰어에게 힉스는 말했다.
![]()
전시장을 나와 걷는데 자꾸만 그 구절이 생각났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일까. 그의 작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하버 프레스 도쿄 북 하울의 마지막 책은 Sheila Hicks의 Weaving as Metaphor. 이 책은 우리가 서점 POST에서 발견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타일 아트의 장인 셰일라 힉스(Sheila Hicks)를 만나게 되었고, 테이블 북 이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책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책 디자이너 Irma Boom이 디자인한 이 책은 디자인으로 Hicks의 작품 세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벽돌만큼 두꺼운 순백의 책, 옆면은 한 장씩 뜯어 재단한 듯 거친 단면을 가졌다. 외관부터 압도적인 이미지를 가졌다.
![]()
디자인적 힘은 겉에서 그치지 않는다. 순백의 면지를 지나, 직조 틀 안의 그리드(grid) 같은 형태로 빼곡히 적힌 작가의 이름을 담은 페이지를 넘기면 왼쪽에는 작가의 작품 사진이, 오른쪽에는 큼직하게 책 제목이 쓰여있다. 그리고 따라오는 작가의 사진. 검은색 어두운 배경에 은빛 숏컷의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작가가 나온다. 이후로도 글씨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하나의 연주곡처럼 다양한 디자인 변주가 계속된다.

디자인적 힘은 겉에서 그치지 않는다. 순백의 면지를 지나, 직조 틀 안의 그리드(grid) 같은 형태로 빼곡히 적힌 작가의 이름을 담은 페이지를 넘기면 왼쪽에는 작가의 작품 사진이, 오른쪽에는 큼직하게 책 제목이 쓰여있다. 그리고 따라오는 작가의 사진. 검은색 어두운 배경에 은빛 숏컷의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작가가 나온다. 이후로도 글씨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하나의 연주곡처럼 다양한 디자인 변주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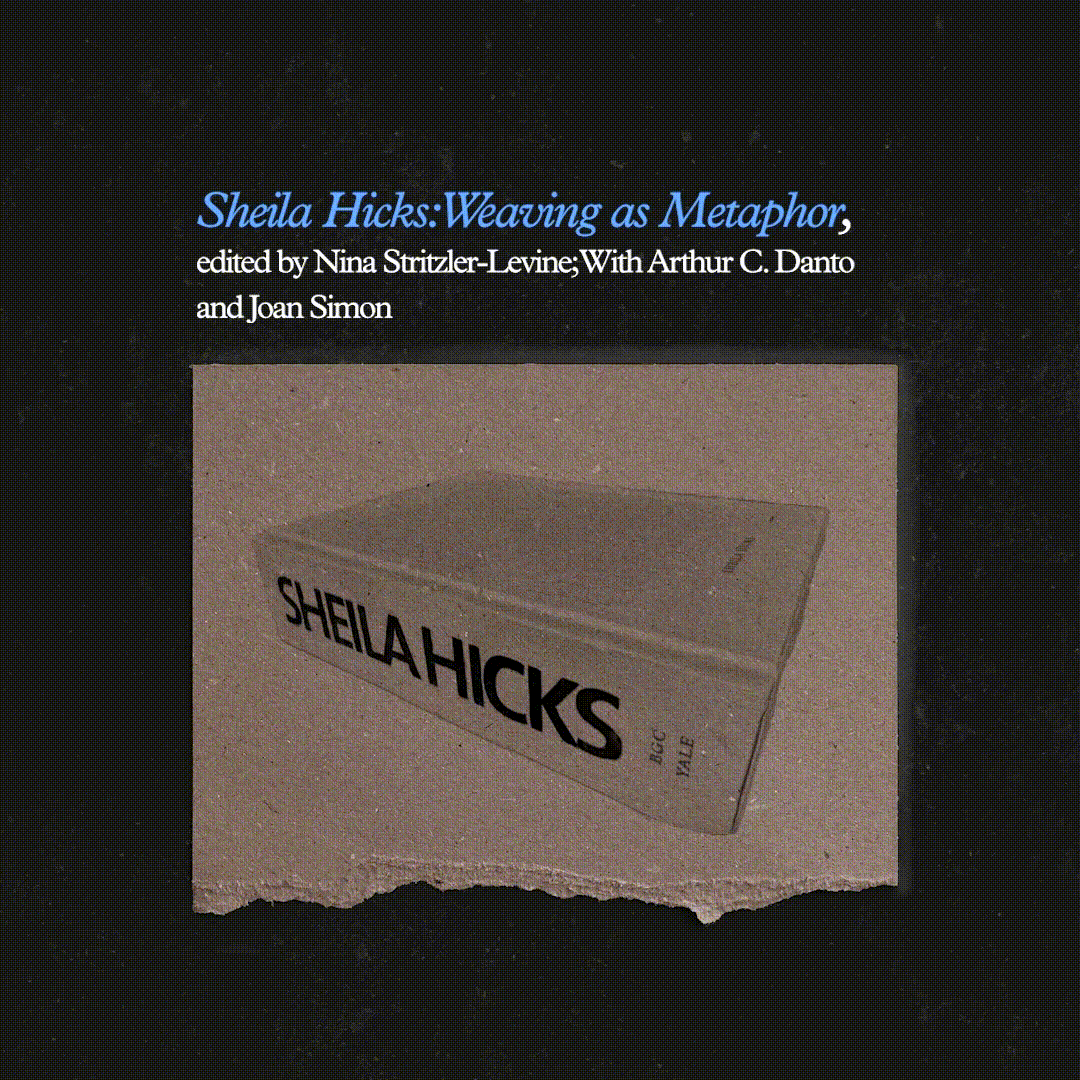
Weaving as Metaphor는 2006년 Bard Graduate Center New York City에서 주관한 전시 도록이다. Hicks의 방대한 작업물 가운데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작품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컬렉터와 미술관 등에 협조를 구해 작품을 빌려와 했던 특별 전시다.
전시를 기획한 Nina Stritzler-Levine은 우연한 계기로 Hicks의 작은 사이즈의 작업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작가의 소규모 작업들이 예술성과 수공예, 디자인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며, 장식예술이 하급 문화로 사료되었던 인식을 흔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 실들이 가로와 세로로 만나며 이루는 모습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텍스타일을 통해 정치나 사회 등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를 알고 나면 이 책의 디자인 역시 서사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날줄과 씨줄이 만나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작가의 철학처럼 이 책은 글씨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컬러의 대비를 통해, 여백 공간을 십분 활용해 내용과 호흡하며 디자인으로 하나의 서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셰일라 힉스 전시가 열리고 있어 다녀왔다. 전시는 Weaving as Metaphor에서 작은 작품을 다룬 것과 반대로 공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사이즈 작품 3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시장의 한 켠에는 셰일라 힉스와 관련된 책들이 놓여져 있었다.




그중 한 전시 도록에 실린 인터뷰가 가슴에 남았다.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거장이기에 그의 오랜 작업에 대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인터뷰를 준비했던 것 같다. 긴장한 인터뷰어에게 힉스는 말했다.
“당신이 나의 작업 모두를 이해하려고 아주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전시는 지금, 여기에,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전시는 지금, 여기에,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전시장을 나와 걷는데 자꾸만 그 구절이 생각났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일까. 그의 작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IDEA Magazine, Transboundary Design – Perspective of Yoshihisa Tanaka
![]()
![]()
![]()
![]()




아이디어 매거진은 1953년도 설립되어 분기별로 나오는 일본의 오래된 디자인 매거진이다. 하버 프레스는 도쿄의 서점들을 방문하다 서점 POST에서 직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추천을 받아 아이디어 매거진을 구입하게 됐다.
![]()
주제 하나를 특정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디자인 매거진. 우리가 구매한 381호(2018년 4월)는 디자이너 요시히사 타나카(Yoshihisa Tanaka)를 조명했다. 그는 도쿄 아트북 페어 전반을 디자인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버 프레스가 도쿄에 갔던 이유 중 하나인 아트북 페어 VI 디자인을 했다니, 우리는 그의 작업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
요시히사 타나카는 조각가 류타 이다(Ryuta Iida)와 함께 아티스트 듀오 Nerhol의 일원이다. 2017년 광주 영은 미술관에서 'Interview, Portrait, House and Room' 전시를 포함해 작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몇 분간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추출한 프레임을 종이에 인쇄해 여러 장 겹쳐 조각하는 작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
그는 물성과 디지털의 집합점에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다. 디지털 세계는 디자인의 지경을 분명 엄청나게 넓혀주었지만, 손에 잡히는 물성이라는 점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Nerhol의 작업은 디지털로 작업한 디자인물을 물성이 있는 실체로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의 실험 중 하나인 듯하다.
![]()
![]()
![]()
![]()
![]()
![]()
![©Nerhol]()
디자이너로서 타카시 홈마가 미국 팝 아티스트 에드 루샤의 사진 책들을 오마주로 만든 작업물의 디자인을 하는 등의 작업, 이세이 미야케 2024 SS 퍼포먼스의 콘셉트 디자인, 린코 가와우치와 테시 베이펜바흐의 사진 책 'Gift'와 토마스 루프 카탈로그 책 디자인, 도쿄의 서점 POST의 로고 및 브랜드 디자인, 뉴발란스와 협업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
![]()
![]()
![]()
아이디어 매거진 381호는 그런 그를 백색과 지움으로 표현했다. 표지 앞면은 Nerhol의 작업물로, 백색의 종이를 겹겹이 쌓아 어떠한 질감을 나타낸 작품 사진으로 꾸몄다. 잡지 뒷면은 대게 광고가 들어가는데 381호 뒷면은 어떠한 광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나 테두리만 남겨진 채 지워졌다. 하단에 바코드도 글도 일부 지우개로 지운듯하다. 잡지의 측면은 칼로 자른듯한 단면이 아니라 울퉁불퉁 질감이 있다. 물성에 관심이 많은 이 작가를 표현하기 위해 잡지의 6면을 모두 최대한 활용해 3D적 접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디자인 매거진답게 관성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해당 호에서 다루는 작가를 디자인으로 말하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
![]()
![]()
![]()
![]()
![]()

주제 하나를 특정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디자인 매거진. 우리가 구매한 381호(2018년 4월)는 디자이너 요시히사 타나카(Yoshihisa Tanaka)를 조명했다. 그는 도쿄 아트북 페어 전반을 디자인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버 프레스가 도쿄에 갔던 이유 중 하나인 아트북 페어 VI 디자인을 했다니, 우리는 그의 작업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요시히사 타나카는 조각가 류타 이다(Ryuta Iida)와 함께 아티스트 듀오 Nerhol의 일원이다. 2017년 광주 영은 미술관에서 'Interview, Portrait, House and Room' 전시를 포함해 작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몇 분간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추출한 프레임을 종이에 인쇄해 여러 장 겹쳐 조각하는 작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물성과 디지털의 집합점에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다. 디지털 세계는 디자인의 지경을 분명 엄청나게 넓혀주었지만, 손에 잡히는 물성이라는 점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Nerhol의 작업은 디지털로 작업한 디자인물을 물성이 있는 실체로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의 실험 중 하나인 듯하다.







디자이너로서 타카시 홈마가 미국 팝 아티스트 에드 루샤의 사진 책들을 오마주로 만든 작업물의 디자인을 하는 등의 작업, 이세이 미야케 2024 SS 퍼포먼스의 콘셉트 디자인, 린코 가와우치와 테시 베이펜바흐의 사진 책 'Gift'와 토마스 루프 카탈로그 책 디자인, 도쿄의 서점 POST의 로고 및 브랜드 디자인, 뉴발란스와 협업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아이디어 매거진 381호는 그런 그를 백색과 지움으로 표현했다. 표지 앞면은 Nerhol의 작업물로, 백색의 종이를 겹겹이 쌓아 어떠한 질감을 나타낸 작품 사진으로 꾸몄다. 잡지 뒷면은 대게 광고가 들어가는데 381호 뒷면은 어떠한 광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나 테두리만 남겨진 채 지워졌다. 하단에 바코드도 글도 일부 지우개로 지운듯하다. 잡지의 측면은 칼로 자른듯한 단면이 아니라 울퉁불퉁 질감이 있다. 물성에 관심이 많은 이 작가를 표현하기 위해 잡지의 6면을 모두 최대한 활용해 3D적 접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디자인 매거진답게 관성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해당 호에서 다루는 작가를 디자인으로 말하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매거진을 펼치면 그간의 요시히사 타나카의 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Nerhol로서 했던 전시 사진들, 그가 작업하는 모습, 그동안 작업한 아트북의 표지와 내지, 도쿄 사진미술관 브랜딩 작업 등을 볼 수 있다. 일어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어떠한 하나의 주제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특히 디자이너들에겐 구매할 가치가 있는 매거진임에 틀림없다. 우리 또한 아이디어 매거진을 통해 요시히사 타나카라는 아티스트를 깊게 만날 수 있어 행운이었다.
그의 작업은 인스타그램 @yoshihisa_tanaka 또는 @ner_hol에서 볼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인스타그램 @yoshihisa_tanaka 또는 @ner_hol에서 볼 수 있다.
Casually Sauntering the Perimeter of Now by
Misha Kahn
![]()
시선을 확 끄는 핑크 벨벳 커버.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책을 펼치자마자 여기저기 휘갈겨 쓴 메모가 적힌 페이퍼북으로 제작된 내용물. 제목도 그렇다. 어찌 의역을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제목.
Casually Sauntering, 캐주얼한 산책, the Perimeter of Now, 지금의 주위. 지금의 주위를 캐주얼하게 산책하는 것이라니. 게다가 perimeter는 수학적 용어다. 어딘가 계속 난해한 뉘앙스가 풍기는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
![]()
Casually Sauntering the Perimeter of Now는 우리가 도쿄 아트북 트립에서 고른 책 중 유일하게 글이 위주인 책이다. 서점 POST에서 국내에 없는 수많은 책을 보며 감탄하던 중 시선을 끄는 외관에 집어 들어 여기저기 휘갈긴 낙서 같은 메모에 첫 페이지부터 압도당해 구매하게 되었다. 우리가 즐겨보는 아파르타멘토 매거진에서 낸 책이니 더욱 궁금했다.
![]()
![]()
![]()
뉴욕 브루클린을 베이스로 하는 미샤 칸은 디자인스쿨에서 가구를 전공하고 가구, 오브제 등을 작업하는 젊은 아티스트다. 이 책에는 10년 남짓한 그간의 작업물과 작업세계에 대해 그의 아티스트 동료들과 일상 속 대화에서 탐험한 것을 담았다. 캐주얼한 산책이라는 제목처럼 네일 살롱, 카페, 식당, 친구의 집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들은 지극히 가볍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시시콜콜 농담 따먹기는 아니다.
![©Misha Kahn]()
책은 Glenn Adamson의 글로 열린다. 그와 인연은 2014년 뉴욕 아츠 앤 디자인 뮤지엄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MAD)에서 아담슨이 관장으로 있을 당시 NYC Makers 기획 전시에서 칸의 피그 벤치를 처음 마주하며 시작되었다.
칸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피그 벤치(pig bench)는 그가 자란 미네소타의 시그니처 가구로 볼 수 있는 통나무 의자 피그 벤치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한 의자다. 그는 디자인스쿨에서 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최대한 작업이 간결해야 한다고 배웠다. 전통적인 피그 벤치는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다리 4개를 달아 손쉽게 만드는 물건이다. 그러나 칸은 이토록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데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속을 파내어 온갖 쓰레기를 한 겹씩 한 겹씩 채우고 굳혀 색색깔 요란한 나이테를 가진 피그 벤치를 만들었다.
![]()
![]()
![]()
어릴 적 토요일 아침마다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티비로 만화를 보던 기억을 떠올리며 만든 Saturday Morning 시리즈는 풍선에 형형색색 피그먼티드 레진을 채워 넣어 굳힌 뒤 겉을 벗겨내 만든 작업물이다. 동화 속에서 나왔을 법한 다채로운 컬러와 모양을 한 이 작업물은 백설공주가 가진 지혜의 거울 같기도 하고, 마치 신데렐라 공주의 방에 있을 것처럼 밝고 예쁜 색감을 가졌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어린 시절 아름다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듯한 이름이나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살짝 바람이 빠진 듯 슬픈 분위기를 풍긴다.
칸은 이 시리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왜 있잖아요, 파티에 풍선을 들고 갔는데, 그 파티가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어야 했던 기억이요.” 생각해 보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만화를 보는 일이란 언뜻 생각하기에 평화로운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겐 그밖에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어 외로운 기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칸은 속담이나 인용구, 혹은 어떠한 고정관념으로 ‘플레이’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에는 역동적인 아름다움 너머로 슬픔이 종종 보인다.
![]()
![]()
![]()
![]()
![]()
![]()
![]()
![]()
![]()
![]()
피그 벤치, Saturday Morning, Kon TiKi. 모두 한 아티스트의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칸의 작업은 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한 사람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생김새와 작업 방식, 표현 방식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다양하다. 유리, 금속, 캐시미어, 지푸라기, 쓰레기, 레진, 플라스틱 등. 그가 활용하는 재료에도 한계가 없다.
그가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는 힘은 불편함에서 온다고 한다. 까다로울수록, 불편할수록 더욱 도전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쉬운 것은 속임수 같다는 작가 미샤 칸, 마치 모터라도 단 듯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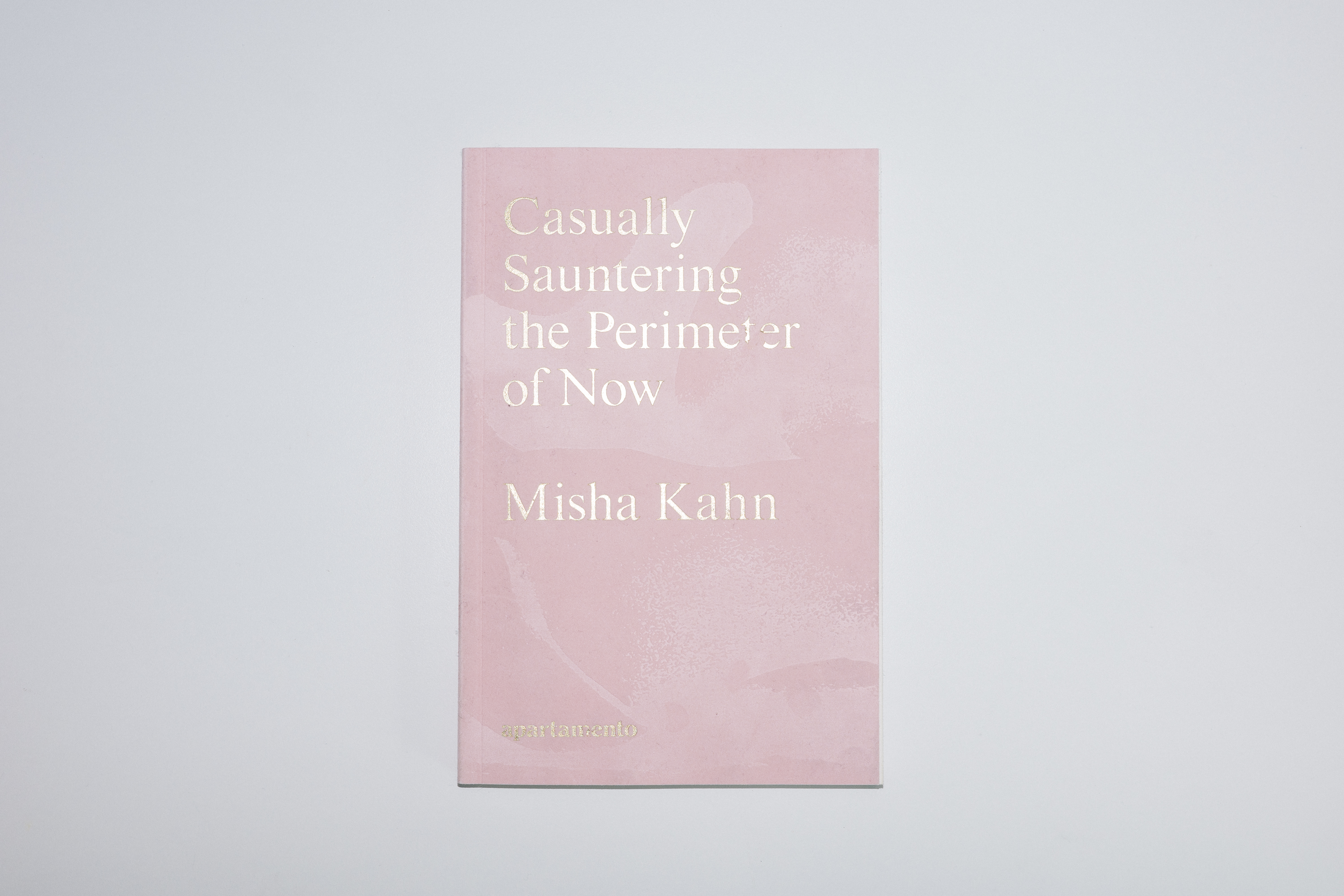
시선을 확 끄는 핑크 벨벳 커버.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책을 펼치자마자 여기저기 휘갈겨 쓴 메모가 적힌 페이퍼북으로 제작된 내용물. 제목도 그렇다. 어찌 의역을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제목.
Casually Sauntering, 캐주얼한 산책, the Perimeter of Now, 지금의 주위. 지금의 주위를 캐주얼하게 산책하는 것이라니. 게다가 perimeter는 수학적 용어다. 어딘가 계속 난해한 뉘앙스가 풍기는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Casually Sauntering the Perimeter of Now는 우리가 도쿄 아트북 트립에서 고른 책 중 유일하게 글이 위주인 책이다. 서점 POST에서 국내에 없는 수많은 책을 보며 감탄하던 중 시선을 끄는 외관에 집어 들어 여기저기 휘갈긴 낙서 같은 메모에 첫 페이지부터 압도당해 구매하게 되었다. 우리가 즐겨보는 아파르타멘토 매거진에서 낸 책이니 더욱 궁금했다.



뉴욕 브루클린을 베이스로 하는 미샤 칸은 디자인스쿨에서 가구를 전공하고 가구, 오브제 등을 작업하는 젊은 아티스트다. 이 책에는 10년 남짓한 그간의 작업물과 작업세계에 대해 그의 아티스트 동료들과 일상 속 대화에서 탐험한 것을 담았다. 캐주얼한 산책이라는 제목처럼 네일 살롱, 카페, 식당, 친구의 집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들은 지극히 가볍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시시콜콜 농담 따먹기는 아니다.

책은 Glenn Adamson의 글로 열린다. 그와 인연은 2014년 뉴욕 아츠 앤 디자인 뮤지엄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MAD)에서 아담슨이 관장으로 있을 당시 NYC Makers 기획 전시에서 칸의 피그 벤치를 처음 마주하며 시작되었다.
칸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피그 벤치(pig bench)는 그가 자란 미네소타의 시그니처 가구로 볼 수 있는 통나무 의자 피그 벤치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한 의자다. 그는 디자인스쿨에서 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최대한 작업이 간결해야 한다고 배웠다. 전통적인 피그 벤치는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다리 4개를 달아 손쉽게 만드는 물건이다. 그러나 칸은 이토록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데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속을 파내어 온갖 쓰레기를 한 겹씩 한 겹씩 채우고 굳혀 색색깔 요란한 나이테를 가진 피그 벤치를 만들었다.



어릴 적 토요일 아침마다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티비로 만화를 보던 기억을 떠올리며 만든 Saturday Morning 시리즈는 풍선에 형형색색 피그먼티드 레진을 채워 넣어 굳힌 뒤 겉을 벗겨내 만든 작업물이다. 동화 속에서 나왔을 법한 다채로운 컬러와 모양을 한 이 작업물은 백설공주가 가진 지혜의 거울 같기도 하고, 마치 신데렐라 공주의 방에 있을 것처럼 밝고 예쁜 색감을 가졌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어린 시절 아름다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듯한 이름이나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살짝 바람이 빠진 듯 슬픈 분위기를 풍긴다.
칸은 이 시리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왜 있잖아요, 파티에 풍선을 들고 갔는데, 그 파티가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어야 했던 기억이요.” 생각해 보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만화를 보는 일이란 언뜻 생각하기에 평화로운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겐 그밖에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어 외로운 기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칸은 속담이나 인용구, 혹은 어떠한 고정관념으로 ‘플레이’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에는 역동적인 아름다움 너머로 슬픔이 종종 보인다.










피그 벤치, Saturday Morning, Kon TiKi. 모두 한 아티스트의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칸의 작업은 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한 사람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생김새와 작업 방식, 표현 방식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다양하다. 유리, 금속, 캐시미어, 지푸라기, 쓰레기, 레진, 플라스틱 등. 그가 활용하는 재료에도 한계가 없다.
그가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는 힘은 불편함에서 온다고 한다. 까다로울수록, 불편할수록 더욱 도전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쉬운 것은 속임수 같다는 작가 미샤 칸, 마치 모터라도 단 듯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Sihhatler olsun by Aslı Özçelik
![]()
![]()
책등엔 뜨개 리본이 붉은 실로 엮어져 있고 표지에 난 창에는 흰 비둘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손이 보인다.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이 책은 젊은 여성 작가인 Aslı Özçelik이 본인 어머니의 지난 삶을 ‘재구성(rebuild)’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도쿄 아트북 페어의 한 부스에서 이 책을 만났다. 소개된 많은 책들중 이 책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인상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인 사진책처럼 느껴지지 않는 겉모습이 특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
![]()
‘건강하세요’를 의미하는 ‘Sihhatler olsun’은 직접 수작업으로 장식하고 제작된 것 같이 연출되었다. 책등의 장식뿐 아니라 내지에도 메모지나 인화한 사진을 덧붙인 것 같은 작은 페이지들을 삽입했다. 엄마의 손글씨도 그대로 옮겨 넣은 이 책은 펼치면 마치 개인의 사진첩 혹은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당신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작가인 Aslı Özçelik은 독일 Folkwang University of Arts에서 사진을 전공 중인 학생이며, 책의 출판사인 Eigensinn Publishing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다.
![]()
![]()
![]()
![]()
작가는 우연한 계기로 한 달간 어머니와 같이 지내게 되며 어머니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게 된다. 어머니는 터키에서 20년간 살다가 독일로 이주해온 이민자였다. 이민자 여성으로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단기 계약직(guest worker)으로 살아왔다. 그러다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고, 아마 어머니의 지난 삶에서 이런 ‘불안정’은 시시때때로 찾아왔을 것이다.
![]()
이민자 2세대로, 20대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본인 엄마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는 일은 무척 중요했다. 본인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엄마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엄마의 감정과 행동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
![]()
![]()
![]()
![]()
![]() 작가는 어머니의 지난 사진첩들을 들여다보고, 본국에 계신 조부모님과 고향의 정경을 통해 과거를 조명함과 동시에 현재 모습을
작가는 어머니의 지난 사진첩들을 들여다보고, 본국에 계신 조부모님과 고향의 정경을 통해 과거를 조명함과 동시에 현재 모습을
새로 촬영해 함께 엮었다. 수록된 사진들은 혼란스럽던 시간들을 보여주는 듯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근본적으로 피사체의 모든 시간을 감싸 안는 듯 따뜻한 분위기를 지녔다. 어머니의 모든 시간을 포용하는듯하다.
“이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으려거든, 노인에게 물어라..” 어머니의 손글씨를 옮겨넣은 메모 페이지에 적힌 문구이다. 어머니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녀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모든 이민자 여성들의 삶에 대한 찬사,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대비와 위로는 아니었을까.
![]()
![]()
![]()
최근 작가가 작업 중인 시리즈인 ‘Apparently This Is My Biology’는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 작가답게, 온라인에서 자신의 게시물에 달린 가부장적 내용의 댓글을 보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이발소, 펍, 오락실, 기계 조작실 등의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가사일들을 하는 자화상을 촬영했다. 사진 속 작가는 ‘이게 뭐 어때서?’라고 말하는 듯이 반항기 어린 표정으로 반죽을 휘젓고, 다리미를 누르며, 빨래를 털어 말린다.
막 커리어를 시작한 작가의 작업물들은 자전적 이야기가 많다. 그녀의 내면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이 세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책으로 엮였고 도쿄 아트북 페어에서 하버프레스를 만나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되었다. 남은 책들에 대한 소개도 즐겁게 보아주시길 바란다.


책등엔 뜨개 리본이 붉은 실로 엮어져 있고 표지에 난 창에는 흰 비둘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손이 보인다.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이 책은 젊은 여성 작가인 Aslı Özçelik이 본인 어머니의 지난 삶을 ‘재구성(rebuild)’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도쿄 아트북 페어의 한 부스에서 이 책을 만났다. 소개된 많은 책들중 이 책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인상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인 사진책처럼 느껴지지 않는 겉모습이 특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건강하세요’를 의미하는 ‘Sihhatler olsun’은 직접 수작업으로 장식하고 제작된 것 같이 연출되었다. 책등의 장식뿐 아니라 내지에도 메모지나 인화한 사진을 덧붙인 것 같은 작은 페이지들을 삽입했다. 엄마의 손글씨도 그대로 옮겨 넣은 이 책은 펼치면 마치 개인의 사진첩 혹은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당신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작가인 Aslı Özçelik은 독일 Folkwang University of Arts에서 사진을 전공 중인 학생이며, 책의 출판사인 Eigensinn Publishing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다.




작가는 우연한 계기로 한 달간 어머니와 같이 지내게 되며 어머니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게 된다. 어머니는 터키에서 20년간 살다가 독일로 이주해온 이민자였다. 이민자 여성으로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단기 계약직(guest worker)으로 살아왔다. 그러다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고, 아마 어머니의 지난 삶에서 이런 ‘불안정’은 시시때때로 찾아왔을 것이다.

이민자 2세대로, 20대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본인 엄마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는 일은 무척 중요했다. 본인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엄마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엄마의 감정과 행동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촬영해 함께 엮었다. 수록된 사진들은 혼란스럽던 시간들을 보여주는 듯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근본적으로 피사체의 모든 시간을 감싸 안는 듯 따뜻한 분위기를 지녔다. 어머니의 모든 시간을 포용하는듯하다.
“이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으려거든, 노인에게 물어라..” 어머니의 손글씨를 옮겨넣은 메모 페이지에 적힌 문구이다. 어머니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녀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모든 이민자 여성들의 삶에 대한 찬사,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대비와 위로는 아니었을까.



최근 작가가 작업 중인 시리즈인 ‘Apparently This Is My Biology’는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 작가답게, 온라인에서 자신의 게시물에 달린 가부장적 내용의 댓글을 보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이발소, 펍, 오락실, 기계 조작실 등의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가사일들을 하는 자화상을 촬영했다. 사진 속 작가는 ‘이게 뭐 어때서?’라고 말하는 듯이 반항기 어린 표정으로 반죽을 휘젓고, 다리미를 누르며, 빨래를 털어 말린다.
막 커리어를 시작한 작가의 작업물들은 자전적 이야기가 많다. 그녀의 내면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이 세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책으로 엮였고 도쿄 아트북 페어에서 하버프레스를 만나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되었다. 남은 책들에 대한 소개도 즐겁게 보아주시길 바란다.